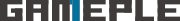최근 게임업계 최대 화두가 ‘모바일’임을 부인하는 업계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아이폰이 국내 첫 도입된 지난 2009년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한 모바일 시장은 지난해부터 게임시장으로 그 화염이 옮겨지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아예 ‘대세’가 됐다.
모바일 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앵그리버드’와 같이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이 나와야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본 관계자들이 상당수였는데 결국 ‘애니팡’이 등장하면서 최근 그 시대의 문도 활짝 개방됐다.
하지만 이처럼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한쪽에서는 우려와 안타까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PC게임이 모바일에 밀려 시장이 작아지거나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최근 온라인게임 시장을 보면 대두될 법도 하다. 몇백억 단위의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신작들이 국내시장에서 여지없이 흥행실패의 쓴맛을 봤다. 특히 게임시장을 주도하는 MMORPG의 경우 기대작이라 불렸던 ‘테라’ ‘리프트’와 같은 작품들이 출시 몇 달만에 인기순위 상위권에서 밀려났다. ‘블레이드&소울’의 경우 꾸준히 상위권에 머무르며 선전하고 있지만 엔씨소프트의 전작 ‘아이온’을 완벽하게 대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 몇년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펀드조성 등 돈줄이 넘쳐났던 분위기도 이젠 그 거품이 사그러들었으며 한국 온라인게임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입해갔던 해외 퍼블리셔들도 작품을 보는 눈이 까다로워졌다. 인기순위 상위권엔 등장한지 10년 넘은 게임들이 여전히 머물며 시장고착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업친데 덮친격으로 제도권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과연 시장의 무게중심은 모바일로 이동하는 것일까. 그리고 분위기가 가라앉은 PC기반 온라인게임은 침체일로를 겪게 되는 것일까.
모바일 시장의 부상과 PC게임 시장의 침체를 겪으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이를 보는 관점이 국내와 해외가 상당히 상반된다는 점이다. 8일 개막된 ‘2012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에 참석한 언리얼엔진의 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대표의 말은 눈길을 끌었다.
스위니 대표는 모바일 게임의 부상이 PC게임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 ‘앵그리버드’ ‘애니팡’과 같은 가벼운 모바일게임이 기존에 게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하게 만들었으며 향후 가벼운 캐주얼 게임 시장과 하드코어 게임 시장이 공존 발전할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몇달전 또 다른 외국계 게임종사자에게 들은 바 있다. 몇 달전 카와우치 시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였다. 카와우치 대표 역시 모바일 게임의 붐이 전체 게임시장의 파이를 넓혀줄 것이며 경쟁이 아닌 공생관계로 유저들이 PS비타와 같은 휴대용 게임기 시장으로 넘어오는 가교 역할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사례를 봤을 때 국내 게임관계자들은 ‘대중의 트렌드 향방’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 외국계 관계자들은 ‘게임의 대중화’에 중점을 둔다. 어떤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를 따질수가 없는 지극히 시각에 대한 문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온라인게임은 국내나 해외 모두 21세기에 들어서 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이제 시작이어서 발전 여지가 아직 많은데다 AOS와 같은 신흥장르의 득세처럼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여지 역시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모바일이던 PC이던 간에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라이프’는 현대인의 삶과 어떤 기기와 접속 경로에 상관없이 보다 밀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차정석 기자
cjs@game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