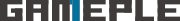게임 하나에 생존권이 달린 e스포츠 선수들


[게임플] “이미 뒤가 없거든요. 다들 구직을 해야 하니까… 오늘 경기를 보고 관심 있는 선수가 있다면 연락 주세요”
지난 19일 ‘2018 LoL 케스파컵(Kespa Cup)’에 출전했던 리버스 게이밍(RGA)의 김지용 코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RGA는 이번 케스파컵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LoL 챌린저스 코리아(이하 챌린저스) 승강전에서 강등되어 프로 팀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챌린저스의 문턱이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는 ‘등용문’이고, 실력이 없다면 그 자리를 더 좋은 실력을 가진 팀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당사자로서는 ‘당연하지’ 않다.
얼마 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하 히오스) 리그 폐지 선언으로 인해 약 160여명의 프로 선수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실직자 신세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뷰, 팬미팅을 진행해왔던 선수들이건만, 졸지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물론 팀 차원에서 선수의 앞날을 관리해준 곳은 많다. 젠지e스포츠는 히오스 팀인 젠지Hots 팀 선수들에게 코칭 스태프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턴십, 스트리머로의 활동 기회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비록 선수로서 뛰던 리그는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선수를 ‘케어’하겠다는 의도다.

비단 이번 히오스 팀뿐만 아니라 후원사가 붙어 있는 팀의 경우에는 선수들의 케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편이다. 하지만 후원사가 없는 팀은 게임의 존폐, 팀의 성적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리는 일이 허다하다. 아직까지 게임 리그, e스포츠가 걸음마 단계이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프로게이머 학원, 아카데미 등 여러 e스포츠와 관련한 저변이 늘어나고는 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공적인 시스템은 아직까지 부족하며, 이를 위한 움직임 또한 전무한 편이다. 해당 리그의 게임사 혹은 e스포츠 협회가 진행하는 확실한 ‘케어 시스템’이 없다.
이는 점차 커지는 e스포츠가 ‘메이저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게임은 공인된 스포츠 종목들과는 달리 특정한 게임 회사와 개발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저작물이다.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선수들의 ‘생존권’ 보장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게임 자체를 공공재로 만들어 관리할 수 없다면, 그 여파에서 가장 가까운 선수들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e스포츠 자체의 위상이 올라간다. 선수가 있어야 스포츠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일반 스포츠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호주에서는 1995년부터 엘리트 선수 직업 교육(ACE-Athlete Career and Education)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독일, 미국 등도 이와 같은 직업 상담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e스포츠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번 발을 들인, 선수와 관계자로서 활동했던 이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영역 안에 들어서는 이들이라면, 팀 차원의 지원과는 별개의 지원을 약속 받아야 한다.

지난 8월 진행된 ‘e스포츠 명예의 전당’ 개관식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 김영덕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e스포츠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e스포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겉으로만 화려한 ‘이름 틀린’ 선수 명판이 아니다. 선수들의 생존권과 인권, 향후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e스포츠가 발전적인 성과를 보였던 한 해였다. 여러 면에서 양지로 올라온 이슈가 많았고, 게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도 많았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한 시기이기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선수들의 ‘생존권’ 보장, 나아가서는 e스포츠의 저변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