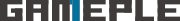전통 스포츠와 따로 보더라도 부정적인 시선이 오간 이번 국감

[게임플] 이 달 1일부터 국내에서는 ‘2018 LoL 월드챔피언십(롤드컵)’이 열리고 있다. 비록 한국 팀이 모두 떨어졌지만, 그 열기는 크게 식지 않았으며 많은 이들이 오는 27일 펼쳐질 4강전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뉴주(Newzoo)에 따르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017년 7억달러에서 2018년 9.1억달러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5.6%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서 e스포츠 시청자 수는 4억명에 달하며, 연령별 e스포츠 시청자 비율은 10대가 27%, 21세부터 35세까지의 연령층이 53%를 차지한다. 자체 부가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영역으로서 e스포츠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의 자사 게임 e스포츠화도 꾸준하다.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MMORPG 블레이드&소울로 비무제를 진행, 2014년부터는 월드챔피언십까지 발전시켰으며, 넥슨은 서든어택, 컴투스는 서머너즈워로 자사 게임의 e스포츠화를 다소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지난 여름에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발탁되어 국내, 외 선수들이 출전해 좋은 경합을 벌였다. 그야말로 e스포츠는 점차 게이머들의 축제의 장,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e스포츠 강국’이라는 자부심도 있기에,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더욱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어제(23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체육회장은 “e스포츠는 게임이다”라고 못박았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질의한 “e스포츠는 스포츠입니까?”에 대한 대답이었다. 물론 전통스포츠로 보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바둑이 스포츠로 지정된 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처럼,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 의원의 질문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과연 e스포츠에 대해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 때문에 이기흥 체육회장의 발언은 e스포츠를 단순히 스포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국내에서는 여전히 게임은 단순한 ‘일탈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이 팽배하기에 문제가 된다.

지난 11일 국감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내보인 이가 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게임장애, WHO 따라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ICD-11에 등재되는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앞서 상술했듯 e스포츠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지난 아시안게임의 출전에 대한체육회가 엮이지 않았더라면 ‘e스포츠는 스포츠다!’라고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하나의 주체적인 ‘문화’로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이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e스포츠가 스포츠로 발돋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선을 그어버리는 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과 진배없다.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해달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만큼의 인식 상장과 함께 지원을 바라는 뜻이 더 크다. 그저 오락, 장애, 질병의 한 분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현재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e스포츠, 게임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게임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나름 나아졌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국감을 지켜보자면 아직까지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
대학생, 연구원들이 AR의 가능성을 외칠 때, 당시 국내에서는 외면했다. 그러다 포켓몬GO라는 걸출한 모바일게임과 함께 해외에서 AR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자 윗선들은 “왜 그때 좀더 열심히 발전시키지 않았냐?”라는 질타를 보내기 바빴다.
해외에서 e스포츠가 하나의 무언가로 자리잡았을 때도 마찬가지 행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언제까지고 기회를 놓쳐 뒤따라가는 행보만을 보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