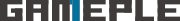그리워서 각별한 존재
[게임플]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을 개발 중인 조이시티의 개발 자회사, 엔드림의 김태곤 상무는 자신이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게임을 첫사랑에 비유했다. 그것도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과 관련돼 올해 진행된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모두.
이런 비유는 비단 김태곤 상무가 창세기전 IP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뤄진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창세기전 IP는 국내 게임시장에서 각별한 존재다.
게임을 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첫사랑과 창세기전을 동일선에 놓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는 이들. 특히 1990년대부터 게임을 즐겨온 이들이라면 창세기전은 충분히 첫사랑에 비유할 수 있는 게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첫사랑은 각별하며, 특별하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계기만 주어지면사람을 추억에서 헤매이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게임이라는 문화를 향유한, 특히 한국 게임산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90년대를 거쳐온 이들에게 창세기전은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존재다.
창세기전은 파격적인 게임이었다. 90년대 당시 SRPG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슈퍼패미컴', '일본 개발사', '언어장벽'이었다. 하지만 창세기전은 이 모든 키워드를 'PC', '한국 개발사','한글자막'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SRPG 장르의 대중화로 이어졌다. 한국게이머들에게 '개척자' 역할을 한 셈이다.
여기에 소설을 읽는 듯한 거대한 세계관과 비극과 희극이 오가는 게임 내 캐릭터들의 다양한 이야기는 유저들이 밤을 새며 창세기전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첫사랑과 밤을 새며 통화를 한 이들이 많은 것처럼.

물론 추억이 얼마나 아름답게 남았냐와는 별개로 실제 첫사랑의 대상과의 연애가 아름다운 이야기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첫사랑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면을 마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즐거웠던 기억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창세기전 역시 마찬가지다. 창세기전은 워낙 오래된 게임이며,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아쉬운 점도 많이 갖고 있는 게임이었다. 설정이 스토리가 진행되며 충돌하기도 했고, 광역기에 의존하는 전투 시스템 때문에 전략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창세기전에 대한 기억을 좋게 떠올리는 것은 그만큼 이 게임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첫사랑과 창세기전이 명백히 다른 점은 소식을 지레짐작 할 수 밖에 없는 첫사랑과 달리 창세기전은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안 듣느니만 못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적어도 창세기전은 추억 속에 멈춰 있는 첫사랑과 달리 계속해서 게이머들과 함께 호흡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게이머들을 1990년대로 돌려보냈다. 당시 자신이 즐기던 게임의 장면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창세기전을 즐기고 있던 당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한국 게임시장을 통틀어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창세기전이 유일하지 않을까.
김태곤 상무가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을 이야기하며 첫사랑을 언급한 것은 무척이나 적절했다. 1995년에 창세기전을 즐겼던 10대, 20대 게이머들은 이들은 이제 첫사랑을 그리워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30대, 40대가 됐으니 말이다.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은 과연 소식을 알게 되서 반가운 첫사랑에 비유할 수 있는 게임일까? 아니면 수필가 피천득이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그런 인연에 비유해야 할 게임일까. 10월 25일을 기다리는 이유다.
관련기사
- '신작 빙하기'에 눈에 띄는 카카오게임즈의 행보
- 김태곤 상무, "창세기전 과거의 IP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기회"
-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 10월 25일 정식 서비스 시작
- 카카오게임즈, 중소게임사 버팀목 될까
- 카카오게임즈,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 티저 영상 공개
- 창세기전의 매력이 뭐길래
- 조이시티 김태곤 "창세기전은 첫사랑과도 같다"
- [시선 2.0] 국내 게임 광고, 어디까지 왔나?
- [시선 2.0] 게임이 장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 이목 집중시키는 주요 콘텐츠는?
- ‘상대를 제압하라’ 대결-PvP 중심 게임 잇따라 출시
-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 사전예약 3주만에 참가자 200만 돌파
- [시선 2.0] 또 PC방 비극을 이용하려 드는가
- TOP 10 진입한 창세기전: 안타리아의 전쟁, 'IP+전략' 시너지 통했다
- [시선 2.0] 정치권 부정적 시선, 국감에서 정면돌파한 게임산업
- [시선2.0] 디렉터스 컷에서 드러낸 엔씨의 큰 그림